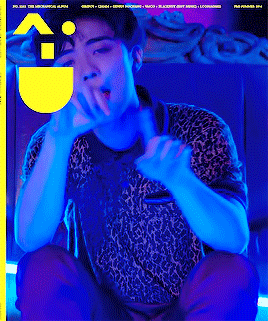대전 가는 버스에 동행했던 사내를 대전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막차에서 또 만났다 완행이었다 내 좌석 바로 뒷자리 술 냄새를 풍기며 사내가 곤히 잠들었다 가끔 손바닥으로 쿵쿵 등받이를 치면서 무거운 몸이 귀찮아 죽겠다는 듯, 늦가을 길 위에서 만난 늙은 풀벌레 헐거운 전신으로 "끙―" 힘겹게 뒤척이듯이 여섯 시간 전 그 사내 버스에 올라 대전에 도착할 때까지 형에서 처조카 선배에서 후배까지 연신 전화를 해대던, 침묵이 두려운 이의 불안이 사뭇 쾌활하게 우렁우렁거리며 응 내가 북파 간첩이잖아, 응, 대전에 집회가 있어 가는 길인데, 응, 북파라니깐, 응, 서울도 가야지, 응, 데모하러, 응, 아니야, 이젠 말해도 돼, 가야지, 응, 내가……
충주 지나 강원도 들어 자그만 마을에 정차할 때마다 화들짝 놀라 두리번거리다가 씨발…… 잠결에 한마디씩 독하게 내밷으며 씨발……풀잎 끝 난간에 앉아 고개를 주억거리는 늙은
명주잠자리처럼 사내가 가끔씩 날개를 털었고 씨발…… 그때마다 어두워진 들녘에서 모래바람이 붉은 반점처럼 번져왔는데
오십이 훌쩍 넘은 덩치 큰 사내가 뒤척이다 별안간 "엄마―"하였다 칼끝으로 그 말이 내 귀를 찔러 누군가 열어놓은 차창으로 왈칵 아까시 꽃냄새 밀어닥쳤는데 엄마……
시방을 떠돌던 남루한 내 연인이 짧고 괴로운 낮잠에 들었다가 "엄마―" 잠꼬대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늦은 봄날이 있었다 어깨를 가만 빌려주고 그의 손금을 쓰다듬어 벌레 먹은 잎사귀를 따내어주던 그날도 내 귓속으로 아까시 아까시 희디흰 꽃냄새가 홍수로 번지던 완행버스 안이었다
/ 범람, 김선우